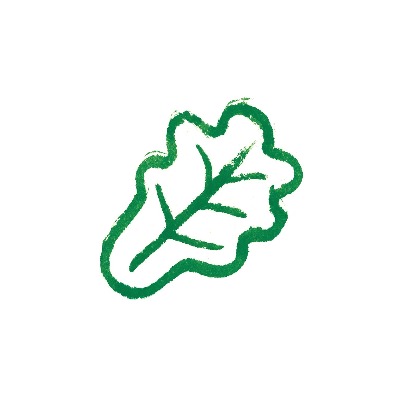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왜, 시골로 내려왔어요?"
"뭐,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생겼죠. 아이를 서울에서 낳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내려오게 되었어요. 악양에서 봄이가 태어났지요."
2008년 가을에 악양에 내려왔다. 내려와서 이런 대답을 백마흔네 번쯤 했다.
2013년, 11월이 되면서 봄이는 자기 생일이 이번 달이라는 것을, 생일에 무얼 하고 싶다든가, 무얼 받고 싶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루에 두 번쯤 한다. 봄이는 이제 여섯 살. 다섯 번째 생일. 생일이 월말께이니 '이번 달 생일' 놀이를 거의 한달 가득 할 수 있다.
봄이는 요즘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집에서 유치원까지 차로 25분쯤. 멀다. 나한테도 멀고, 봄이한테도 멀다. 길은 절반쯤 섬진강을 따라가고, 절반쯤 지리산 골짜기를 따라 오른다. 다행히 주말에는 가지 않으니까, 이 길에 차들이 죽 늘어서 있는 건 보지 않는다.
유치원이 있는 마을은 그러니까, 악양에서 생각해도 한참 산골이다. 학교 옆에 골짜기가 흐른다. 담장에는 골짜기로 내려서는 계단이 세 군데쯤 있다. 여름부터 이곳에 다니기 시작한 봄이는 언니들한테서 개울에서 노는 법을 스무 가지쯤 전수받았다. 뛰고 놀고 넘어지고. 오늘도 유치원 계단에서 넘어져서는 손바닥이며 팔꿈치에 밴드를 몇 장 붙이고 왔다. 이곳이 세 번째 유치원. 그래도 아이가 많은 시간 뛰어 놀 수 있는 편이다.
한 번씩 유치원을 옮길 때마다 이야기가 많았다. 나와 아내는 바램이 단순하므로,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래들과 맘껏 마을을 돌아다니며 뛰어 노는 것. 동갑내기와 투닥투닥하고, 언니 오빠들을 졸졸 쫓아다니고, 거추장스런 동생들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놀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막상 그것만큼 큰 바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마다 아이가 악양이 아닌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그것이 아이한테 무슨 일일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지금 유치원만큼 아이가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없다.
다행인 것은, 봄이는 즐겁다고 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이만큼만이라도 뛰어놀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타작하는 날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손에 갈퀴를 쥐고는 나락 베어 낸 논에서 볏짚을 정리하는 척 하다가, 둘이 논바닥을 뛰어다닌다. 콩을 터는 날에도 보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옆에 두고 농사일을 해야겠다 싶을 때에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농사일 거드는 것은 여섯 살 봄이보다, 세 살 동동이가 좀 더 열심이다. 한두 해 지나지 않아서 금세, 없으면 아쉬운 일손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동동이는 한동안 누나와 함께 유치원에 가다가 그만두었다. 제가 집을 더 좋아한다. 날마다 저 혼자 잘 놀고 있다. 노래도 부르고, 놀잇감도 제 멋대로 만든다. 적당한 때가 되면 동무할 또래들과 지내겠다고 하겠지. 한낮에 몇 장 사진을 찍었다가 다시 돌려보는데, 이 사진이 있었다. 오랫동안 블로그에 글을 적지 못하다가 이 사진을 보고는 부랴부랴 적고 싶었던 말 몇 가지를 보태서 글을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