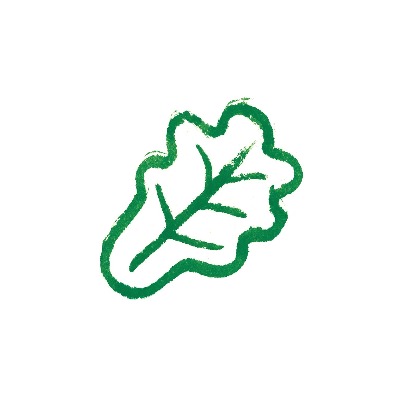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집에 새로 구들을 놓았다.
새 구들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마루에 아궁이가 있다.
오랫만에 찾아온 이가
마루에 아궁이 있는 것을 보고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움집 같은 것에서 불 하나 피우고 살 때에,
그 때 불이라는 건, 그것 하나로
먹을 것을 익히고,
주위를 밝히고,
집을 따뜻하게 데워서
목숨을 잇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둘러 앉아서 불을 그저 바라보는 것.
불을 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들이 지금은
부엌에 까스불이 되고,
집 안 조명이 되고,
또 방바닥 보일러가 되었는데.
마지막 것,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텔레비전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 칸 집.
방이 두 칸. 부엌 한 칸.
방 하나는 보일러.
하나는 구들.
보일러 방 아래에도 구들은 있다.
그리고 원래 구들방이었던 것은 예전 방식대로
아궁이와 구들이 있던 것.
아궁이에서 음식을 하거나 물을 데우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방 두 개에 구들 하나를 놓기로 했다.
아궁이는 실내, 마루에 놓고.
이것이 원래 구들방의 개자리.
깊게 파 있다.
날마다 아궁이에 불을 때고,
아침 저녁으로 가마솥에 밥을 짓는 삶이라면,
늘 뜨끈한 방바닥이었겠지.
두 방을 나누는 벽, 아래쪽을 트기로 했다.
대살을 엮어 흙을 친 벽.
지금도 여전히 살림채, 남아 있는 사방 벽이 이런 흙벽이다.
한지를 바른 벽은 언제든, 만지면 따뜻하다.
새로 놓는 구들은 구들하우스의 낮은구들로 했다.
https://cafe.naver.com/ghousesystem
구들이 어려운 것은 대개 집 생긴 것에 따라
구불구불하고, 비스듬하고, 정해진 것이 없어서가 아닌다 싶다.
구들돌이라는 것도 구름마냥 제 멋대로 생겨 있고.
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어려서부터 몸이 익은 사람이라면
능숙하게 해낼 테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구들은 아무래도 놓고 나서도 꽤 한참,
여러 번 들여다 보아야 하게 마련.
구들하우스의 낮은구들은 시공할 때
거의 반듯반듯하게 구들을 놓는다.
아랫목에 두꺼운 돌을 놓거나,
고래나 개자리를 깊게 파거나 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직접 구들을 놓아야 했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놓아도 가장 하자가 없겠다 싶은 것.
그러면서도 나무 적게 들고,
온기가 오래 갈 것 같았다.
부산에 있어서, 직접 가서 보고, 놓는 것도 배우고.
그러고 나서 결정.
물론 마음처럼 간단하지는 않았다.
역시,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보름쯤 불을 넣고, 연기가 새는지 보고,
불이 잘 드는가 본 다음.
벽지를 바르고, 장판지를 깔았다.
한참 공사가 있었지만,
방은 다시 원래 모양이 되었다.
아, 두 방 사이 벽 아래쪽이 열렸지.
날마다 저녁을 먹은 다음
불을 넣는다.
불을 넣고 있으면,
그 앞에서 한참 멍하니 불을 보고 있다.
아이는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만화책을 본다.
식구들이 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