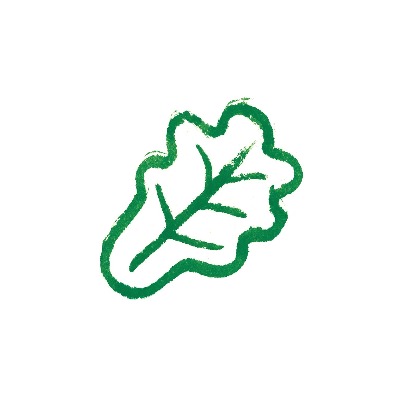가마솥 배쨈, 그리고 보내드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짧은 덧붙임.
가마솥 배쨈, 그리고 보내드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짧은 덧붙임.
쌀이나 유자차, 석류 효소, 콩은 별다른 일 없이 잘 갔지만, 배쨈은 저희가 잘 확인을 못 했어요. 배쨈을 충분히 여러 번 만들어 보지 못 한데다가.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건 처음이었지요. 정제 설탕으로 만든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거니 하고 보내놓고는, 그제서야 담아 두었던 쨈 뚜껑을 열고 빵에 발라먹어야겠다 했지요. 어어엇, 헌데 이게 너무 되직한 거예요. 게다가 너무 추운 곳에 두었더니 꿀이 소는 것처럼, 몽알몽알 단 알갱이가 생겼지 뭡니까. 꿀을 따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꿀이 솔다.'라고 하는데, 마치 설탕 알갱이처럼 당분이 맺히는 거죠. 여튼, 좋은 재료 썼다고 비싸게 받아서 처음으로 나눴던 건데, 이 모양이라니. 부랴부랴, 과수원에 전화부터 했지요. '저 혹시 배 남은 것 있나요?' 다행..
 유자차
유자차
처음부터 유자차를 담글 작정은 아니었는데... 처남이 한동안 거제도에서 지냈어요. 어느 날 와서는 하는 말이 시장에 유기농 유자가 나왔는데, 생긴 게 못 생기고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산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덤으로 준다고 하는 걸 안 받아 가더래요. 못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 한의원 하는 집에 유자밭이 있다는데, 거기거 유기농으로 키운 걸 팔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동네 시장 과일가게에 부탁해서 파는 거라지요. 참, 아직도 유기농 과일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더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겨울에 유자차만큼 달고 맛있고 따끈한 게 없는데(제대로 담근 거라면 모과도 좋지. 흠) 유자는 껍질째 먹잖아요. 농약친 것은 먹기 싫은 덕분에 머릿속에 쓸데없이 아는 게 생기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