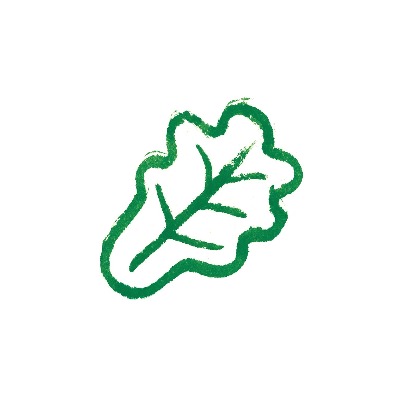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작년 여름 어느 밤.
그러니까 아직 세 돌이 되려면 너댓달이 남았을 무렵이었다.
봄이를 재우면서 말했다.
- 봄아, 이제 자자. 일찍 자야 키가 크지.
- 그런데, 봄이는 키 커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응.
- 왜?
키가 커서 앵두가 많이 딸 수가 있잖아.
- 또?
옥수수하고 열매도 따고.
어른이 되는 것, 얼른 키가 커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가는 봄이는 지난 겨울에 이런 얘기도 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네 식구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루를 잘 보내고, 꽤 다정한 모드의(!) 엄마 아빠와 오면서
갑자기 뜬금 없이 한다는 말이.
키가 많이 커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소리지르고 싸울거야.
안 지고...!
이 무렵에 자주 혼나고 그랬다. 어쨌거나, 얼른 키가 크고 말리라는
또렷한 목소리로 차분히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시 앵두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옆집 앵두나무에는 도대체 앵두라고 하기에는 쫌 부끄러울 만큼
열매가 달렸다. 이건 감이나 사과도 아니고. 이파리를 헤치며
열매 찾기 놀이를 해야 하는 판이다.
옆집 앵두가 익어가니,
봄이 입에서 앵두 따 먹자는 말이 삼시 세 때 떠나지를 않는다.
하루이틀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지만,
마침 전날 옆집 할매 할배도 따먹으라 했겠다.
봄이한테 밤에 이야기를 했다.
- 봄, 내일 앵두 따 먹을까?
좋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따 먹어야 돼.
- 근데 키가 아직 안 커서 앵두를 어떻게 따지?
걱정하지마. 사다리를 이용하면 돼.
- ...
사다리에 올라 가서 조금 따 보고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는다.
옆집 대문 앞에 철퍼덕 앉아서는 저러고 있다.
가지 째 꺾은 앵두를 따 먹으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오늘 저녁까지 계속 따 먹자.
- 아빠, 우리 집에도 앵두 심을까?
집에는 심을 자리가 없는 걸.
- 밭에다 심으면 되지. 뭘.
얼마 전 계단에서 굴러서 얼굴을 깎은 동동이는
이 사건으로 한층 성숙해졌다. ㅋ
앵두는 먹기가 사나워서인지, 단맛이 덜 해서인지
별 관심이 없다. 빗자루에 쓰레받기에 누나가 어질러 놓은 골목을 치우겠단다.
벌써 앵두 다 떨어진 지 나흘쯤?
봄이는 내년 앵두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