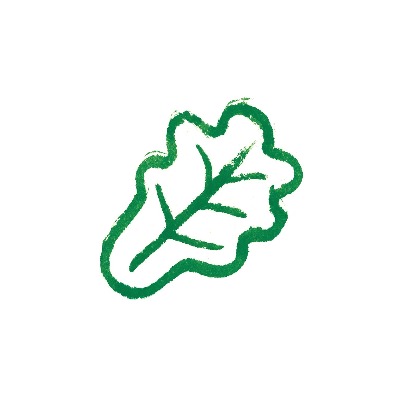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저녁을 먹고 나면 여섯 시, 일곱 시 이렇습니다.
한 녀석씩 불러다가 얼굴과 손과 발을 씻깁니다.
살림채 화장실의 세면대는 조금 높습니다.
봄이는 가끔 혼자 씻고, 자주는 씻겨 달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묻기 전에 그냥 제가 데리고 씻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씻도록 두면 소매 끝을 자주 적시니까,
깔끔하게 잘 씻나 안 씻나를 신경쓰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적실까 싶어서, 혼자서 또 한참 노니작거릴까 싶어서,
데리고 씻깁니다.
누나가 씻고 있을 때, 동동이는 치카를 달라고 하거나,
뒤에 서서는 손만 스윽 내밀어서 세면대 물을 만지거나 합니다.
아이 둘이 놉니다.
이제 조금씩 둘이 놉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거나 그러지는 못 해요.
재미있고 유쾌하게 노는 것도 잘 하지 못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만큼은 날마다 아이들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언짢은 일이 있거나, 삐졌거나, 뭐 그런 까닭으로
혼자 먼저 누워서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날이거나, 또 대개는 그렇듯, 편안한 마음이거나,
어떤 날이든
식구 모두 한 방에 눕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봄이와 동동이가 열 살쯤 지나면 아마도 넷이 같이 눕기에는
방이 좁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방에 넷이 눕습니다.
부엌 쪽 벽에 제가 눕고, 그 옆에 봄이, 그리고, 아내, 동동이. 이렇게요.
가끔 봄이와 동동이가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봄이가 저한테 혼났을 때, 그런 날에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잠이 든다 싶은 날에는 여덟 시가 되기 전입니다.
아홉 시를 넘기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 때, 마을이 깜깜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잠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때 아이들과 같이 누워서 잠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