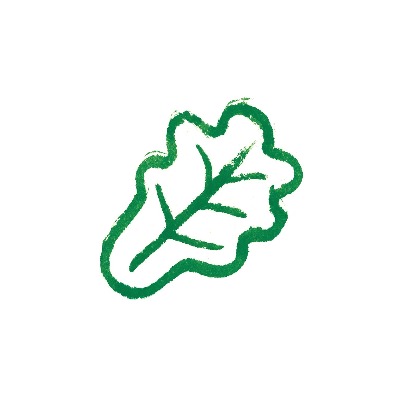읍내에 나가는 것도 오랫만.
봄이네 집에서 하동읍내 가는 길은 섬진강 따라 가는 바로 그, 벚꽃길입니다.
지난 번 읍내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한겨울 풍경이었습니다만,
이미 온 사방에 매화며, 산수유며, 앵두, 개불알꽃, 지천입니다.
벚꽃도 투툭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꽃마저.
겨울이 길었고,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올해도 아마 앞뒤 못 가리고 꽃들이 피어날 기세입니다.
저 많은 꽃들, 벌들은 바빠서 어쩌나 싶습니다.
한 자리에 한두 꽃이 너무 많으니, 보기에 무척 힘이 듭니다.
오늘 간단한 이야기는 쌀.입니다.
쌀에 대해서라면 언제나 간단히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튼, 두 번째 책을 인쇄하기 전에 적어두고 싶은 것.
상추쌈에서 펴내는 두 번째 책은
<나무에게 배운다>이고,
책의 번역자는 최성현 선생입니다.
시골살림과 책, 이 두 가지에 모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름을 들어보았을 공산이 큰, 그런 번역가이지요.
직접 쓴 책도 여럿 있구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쌀.

바로 이 쌀입니다.
악양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의 쌀로 이렇게 여러 날 밥을 지어 먹은 것이 처음입니다.
책을 펴낼 준비를 하면서 최성현 선생을 직접 만난 것은 두 번입니다.
책 펴내는 일이 즐거운 큰 까닭 가운데 하나는 만나보고 싶었던,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선생을 뵈었을 때, 뜻밖의 기회였는데,
선생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농사를 어찌 짓고 있는지 들었던 터라,
그 쌀, 맛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숙소를 마련하고, 찬거리를 조금 할 테니,
쌀을 들고 오시라 했어요. 통통이 반찬과 함께 직접 농사지은 쌀을 가져오셨고,
그 밥맛이란.

한 번 밥맛을 보고 나니,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살고 있는 곳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밀 농사는 어렵지요. 추우니까.
기회를 보아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밀가루하고 국수하고 드릴 테니, 쌀을 내놓으세요!!
작은 우체국 택배 상자에 쌀이 두 됫박 가까이 담겨 왔습니다.
아마, 최성현 선생처럼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쌀이 모든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느닷없는 비유입니다만,
저희 쌀과 최성현 선생의 쌀은 아사다와 김연아.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참 잘하는 선수인데요. 어쨌거나 시상대에 올라서서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표정이라니, 대회에 나선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다른 선수들을 보라고!)
봄이네가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첫 번째,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유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한 가지 이유는
맛있어서. 입니다.
맛이 없는데도, 다섯 해째 유기농을 고집할 수 있었을까요. ... (그럴리가... ^^; )
저와 아내가 합심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밥상, 밥그릇, 이불. 뭐 이런 것들이에요.
끼니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을 쓰고 싶다. 하는 비슷한 취향인 것이죠.
그래서 잠 자는 방, 밥 먹는 부엌도 이제 서까래를 올린 지 사십 년이 더 된 삼칸집을 고집하는 것이구요.
잠자리에 누우면 팔뚝만큼 얇고, 구불구불한 서까래가 보이는 것이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어렵게 마련한 나무들이었겠지요. 요즘 짓는 우람한 한옥들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날마다 꿀잠을 자도록 돕는 집이에요.
봄이도 말문이 트인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집 참 아름답다.'라고 했으니
제 말이 그럭저럭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 너무 멀리 갔네요. 다시, 쌀.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쌀은 맛있습니다. 같은 씨앗으로 같은 땅에서 지은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비료로 키운 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맛있고 좋은 유기농 재료로 맛없는 먹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무언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거나,
봄이네가 이런 생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봄이네 쌀이 맛이 있어요. 책 펴내면서 돈 대신 쌀로 인세를
주기도 했는데요. 돈은 없고, 쌀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었다면,
그것을 거리낌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동력 하나는 '우리집 쌀은 맛있으니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날마다 끼니마다 밥이 맛있습니다. 과식의 위험이 늘 뒤따르는 밥상이에요.
(덧붙여, 오늘 밥상에는 쑥국 + 쑥부쟁이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봄나물 챙겨 드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저에게
아사다와 김연아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쌀이 나타난 것이지요.
사진은 마지막 한 끼 분량이 남았을 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찍었습니다.
동동이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쌀, 쌀'을 외치며 달려와 주워 먹습니다.
저희 집 쌀도 좋아하지만, 아이의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농사짓는 것이 다른 만큼(그 다르다는 차원이 참으로 다른 만큼) 쌀도 맛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이라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저것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파집니다.
처음 쌀을 받고서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쌀 냄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쌀뜨물로 끓인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가도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배운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억지로 배우는 것은 몸에 좀처럼 붙지를 않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남이 할 수 있다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자신이 어딜 모르고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먹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둘째를 고민한다는 부모에게,
아이가 한 명인 것과 두 명인 것의 차이를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쌀이었지요. 최성현 선생의 쌀은.
맨처음 선생이 당신 스스로는 이러이러하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 하던 것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쌀, 며칠 전에 마저 다 먹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