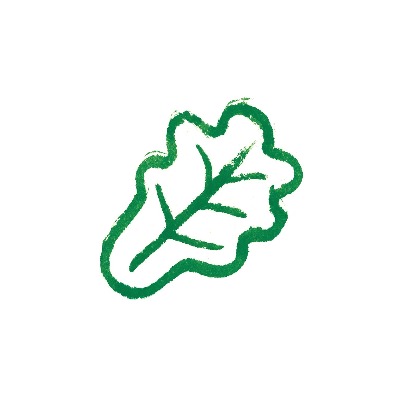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
면사무소 앞에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그저 동네마다 있는 마트 정도이지만, 이곳에서는 면에서 가장 큰 가게이지요. 가게에 통 가는 일이 없는 할매 할배를 빼고는 어지간한 면 사람들은 다 드나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작이 한달쯤 남았을 때,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묻습니다.
'나락 잘 됐나?'
그때만 해도 과연 올해 타작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농약 안 친거야 우렁이가 대신 해 줘서 그럭저럭 풀은 없었지만,
비료 안 하고, 그나마 유기농 자재라고 사다가 넣은 퇴비나 효소 따위는 타이밍 놓쳐, 양은 모잘라, 성분은 신경 안 써. 게다가 물대기도 엉망이었지요. 덕분에 타작할 때가 되어가는데도 나락 사이로 골이 훤히 드러나서 논바닥이 보입니다. 남들 논에 이삭이 패서 숙일 때 그제서야 우리 논에 이삭이 팼지요.
윗논 할배의 걱정은 '그거 기계가 들어갈지 몰라.'라는 것이었고, 그 사정을 가게 아주머니도 알고 계셔서 저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그 가게 아주머니가 아신다니, 아마 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만 몰랐습니다. 뭐, 사실 아는 거 빼고 다 모르는데, 아는 게 거의 없지요.
타작하는 콤바인이 벼를 베고 털려면, 벼 키가 적어도 50cm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기계가 다 있나.
아니, 대체 그걸 왜 아무도, 여지껏, 가르쳐 주지 않았나. 하지만 늦었죠. 올해 농사를 이따구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콤바인이 키 작은 벼는 베지 못 한다는 걸 몰랐을 텐데. 타작할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새 좀 자라주지 않을까...
 |
하지만. 결국 제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낫으로 벼를 베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벼 포기마다 키부터 재고 싶었지만, 여하튼 키 작은 벼는 콤바인이 베지 못하고 씹는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아마 이걸 가르치는 귀농학교나 벼농사 책은 없을 겁니다. 낫으로 베고 싶지 않으면, 요소 비료라도 넣었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콤바인이 벨 수 있을 만큼 자란 쪽은 한 포기라도 더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낫질. 얼추 네 마지기쯤.
덕분에 제대로 낫질 배웠습니다. 장인 어른 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혹은 그보다도 느린 낫질이지만, 그래도 벼베는 낫질은 조금 손에 익었습니다.

왼쪽은 콤바인이 벤 벼. 오른쪽은 낫질로 벤 벼. 워낙 벼가 작아서 낫질을 거의 땅바닥에 대고 훑듯이 했습니다. 콤바인이 벨 수 있겠지 하면서 남겨 놓은 벼 가운데 한 줄로 나란히 열 포기 정도는 이삭이 반쯤 뜯겨 나간채 논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50cm. 이게 요즘 콤바인이 벨 수 있는 높이랍니다. 올해 공들여 벼를 아주 짤막하게 키운 덕분이 아니었으면, 내내 이 사실을 몰랐겠지요.
 |
온 식구가 다 논에 나왔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이틀이 넘게 걸렸어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가장 왼쪽에 봄이가 있습니다.
벼는 베어서 나란히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베어 놓았다가 결국 다시 콤바인을 부릅니다. 그거 말고 탈곡기가 없어요. 볏단을 하나씩 들어올려서 콤바인으로 탈곡. 역시 콤바인 만세.
 |
낫질하는 내내 신난 건 봄이. 논에서 하루종일 혼자 잘 놀았습니다.
 |
'이걸로 밥 해 먹는 거야.' 먹는 걸 아는지 역시 좋아합니다. 옷까지 저렇게 입혀 놓으니 도무지 딸 같아 보이지 않지만.
 |
여튼 논에 있는 내내 한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
개켜 놓은 빨래 헤집기, 책장에서 책 빼기, 서랍에서 옷 꺼내기.
이날도 가장 즐겨한 놀이는 가지런한 벼 하나씩 꺼내서 어질러 놓기.
 |
첫날 윗도가리.
 |
둘째날 아랫도가리.

타작을 시작하기는 가장 먼저 한 편이었지만, 우리 논만한 다른 논들은 콤바인이 들어오면 대략 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저 하얀 원통은 소 여물하려고 볏짚을 싸 놓은 것인데, 우리보다 늦게 타작했지만, 낫질이 끝나기도 전에, 저 논은 볏짚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
이튿날도 봄이는 여전히 잘 놀았습니다.
 |
논바닥에서 기어가는 벌레 보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
낫질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콤바인이 들어와서 탈곡을 했지요. 벼를 하나하나 기계에 올려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거의 두 배가 걸렸고,
콤바인 주인이 장인 어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오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움직이면서 벼를 베야할 기계를 세워놓고 하니 몇 번이나 멈췄구요. 원래 혼자 하는 일을 넷이서 하는데도 네 사람 모두 탈곡이 끝날 때쯤에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소출이 많습니다. 작년 것에 절반은 넘었으니까요. (작년에는 8월에 논을 샀으니
예전에 그림책 편집할 때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낫질하고, 한쪽에서는 콤바인이 하고.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했는데. 흠. 흠. 이렇게 간단히 직접 겪게 될 줄이야.
콤바인 하는 것은 사진이 없습니다. 기계에 맞춰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콤바인으로 탈곡을 마치고 일 해 주신 분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악양에서 가장 유명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논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마을에 그 논 봤나?'
'뭐, 어디?'
'와, 거거 그 골짝 우에 논이 피밭이든데?'
'아, 그기. 00논 아이가. 글마 그 똘아이라. 여즉 물이 방방해. 그래도 그기 작년에 대면 양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