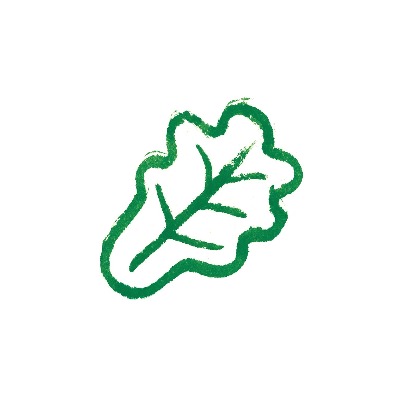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메주콩.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서울 살면서는 한 번도 사 보지 않은 곡식.
된장이든, 간장이든. 콩나물이든, 두부든.
무엇이든 콩과 물과 소금 정도의 배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꽤 놀랐지요.
메주 쑤는 날은 김장 하는 날 못지 않게 중한 날이니, 아이들 모두 곁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올해는 겨울이 따뜻하니까 메주 삶는 것도 좀 더 추우면 하자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날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셋이 저마다 메주 한 덩이씩 만들어 보겠다고 찹찹찹, 맨손으로 콩 찧은 것을 두들깁니다. 옆에서 조금씩만 거들면 어느 틈에 메주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는 해요. 올해 세 살이 된 막내 녀석은 삶은 콩을 줏어 먹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두들깁니다.
봄이 외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콩을 삶습니다. 메주 쑤는 날은 뒤꼍 한쪽에 걸어 놓은 가마솥에서 하루 내내 김이 납니다.
처음 화덕 만들던 이야기도 적어 두었습니다만. 이 가마솥 화덕, 쓰면 쓸수록 빛을 발합니다. 처음 만들 때 보통 화덕을 만드는 수고보다 조금 더 공을 들인 것에 견주면, 가마솥에 불을 피울 때마다, 나무는 반 가까이 적게 들고, 화력은 훨씬 좋아서 무엇이든 금세 끓고 그럽니다. 올해에는 구들방을 다시 손볼 요량인데, 구들을 놓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여튼 처음 해 보는 일이 많은 만큼, 사는 일이 언제나 신세 지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콩을 삶는 동안 저는 옆에 기웃거리면서 콩이 얼마나 익었나 한 알 두 알 자꾸 집어 먹습니다. 이때는 콩에 물 말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도 삶은 콩이 아주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래요. 강이가 줄곧 콩을 집어 먹는 것도 그만큼 맛있기 때문이겠지요. 여하튼 가마솥 뚜껑이 열릴 때마다 자꾸 집어 먹어야 콩이 이만치 익으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조금은 익숙해져야 콩 삶는 일도 제가 맡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 돌 절구가 없었어요. 들통에 넣고 한 사람은 통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들썩이는 통에서 공이질을 하고 그러느라 힘이 몇 배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구질을 하면서 "메주는 그리 찧는 기 아이야. 서 가지고 곡식 찧듯이 쿵쿵 하믄 안 되고, 촵촵촵 이리 소리나게 찧야지. 그래야 콩이 찧어진다고. 매 찧아가 콩알 안 보이게 찧아. 된장 풀 때 콩알 남으믄 얼매나 아깝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돌 절구도 생겼겠다, 작년보다 힘은 덜 들이면서도 아주 매 찧었습니다. 절구질을 해서 메주를 찧다 보면 콩이 찧어질수록 공이가 잘 안 떨어지는데, 하다하다 공이 한번 들어올리는 것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콩을 찧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덕분에 마당에 내걸린 메주를 보고는 지나는 동네 핼매들이 "아이고, 이 집 메주는 참말로 곱게도 찧았네." 하시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절구질 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어서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가득이었는데, 그래도 할매들 말을 들으니 좋더라구요.
그렇게 절구에 콩을 찧은 다음 밥상에 올려 놓고 메주를 빚습니다. 아이들이 젤로 신나하는 때예요. 절구질 할 때에는 옆에서 자기도 해 보겠다고 조르다가도 한번 공이질을 하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 금세 그만두는데, 메주 빚는 것은 별로 힘이 들지는 않으니까 셋이 나란히 상 앞에 앉아서 찹찹찹 메주를 두들겨요. 온 데다가 콩 묻히고 메주를 주물럭대 놓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장 담그는 일을 어려워 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장을 담가 먹게 된다면 좋겠어요. 시골에서 메주를 빚고 장을 담그면서 된장이든 간장이든 정말로 콩, 물, 소금 말고는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지금도 낯선 느낌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