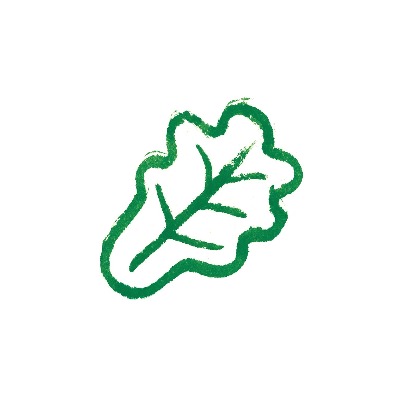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저녁에 상추쌈을 먹었습니다. 처음 먹는 거였어요. 춘분을 하루 앞두고 상추쌈을 먹다니. 잎은 작고 아삭아삭하고 고소하고, 또 단맛이 났어요. 겨울이 따뜻한 곳이어서 그런가, 마치 시금치나 냉이나 쑥처럼. 상추도 죽지 않고 겨울을 넘긴답니다. 이건 요즘 따뜻해졌다고 갑자기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넘긴 상추입니다. 겨울을 넘긴 상추는 처음이지요.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노지에서 겨울을 보낸 상추. 이제 조금 지나면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면 밭을 갈고 새로 무언가를 심어야 하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에 따서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먹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만큼 크지 않거든요. 그덕에 우리도 얻어 먹었어요. 상추잎이 김장배추 노란 속잎보다 작고, 그것보다 더 달고 고소합니다.
시골 살면서 누리는 호사가 이런 거다 싶습니다. 상추 따는 밭을 보았다면 사진이라도 한장 올렸겠지만, 밥상 위에 올라온 상추 찍을 정신은 없었어요. 때때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수저가 아니라 사진기를 집어 드는 마음이 신기할 때가 있지요.여하튼, 이렇게 적어놓았으니 일기 하나는 제대로 쓴 겁니다. 상추가 화제거리에 올라온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요.
____
다른 얘기.
저도 가끔은 밥상머리에서 사진기를 꺼내듭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러지요. 제 또래 사람들부터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블로그에도 내가 왜 쓰나, 따위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 한번씩 하고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 블로그는 누구누구가 읽는지 뻔합니다.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제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여주는 낙서장. 같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갑작스러운 삶의 회전. 앞에서 스스로 살피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결이 앞으로 어찌 흘러갈까. 자꾸 돌아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그러기에 제게 글쓰기보다 익숙한 일은 없거든요. 정말이지 천만다행으로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이게 즐겁습니다.
글쓰기.여서 다행입니다. 누군가는 음악이고, 영화이고, 미술이고, 여행이고, 사진이고, 학문이고. 여하튼 저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든 한 가지 이상,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대를 나누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뭐든 잘 아는 장르 하나를 꿰차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뭐 여튼.
제게 책읽기-글쓰기는 무엇보다 가장 깊고 분명하고 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좌우하거든요. 어떤 책에 골몰해 있는데, 그게 번역서다. 그러면, 생각마저 번역투로 합니다. '그렇네, 오늘 아침 풍경에 있어서 시선을 둘 만한 것은...' 이런 식으로다가, 대개 끄적거려 놓는 낙서들도 그 때 그 때 읽고 있는 책의 어투를 따라 갑니다. 결국 생각의 방향, 문제의식, 관심있게 시선을 두는 곳, 이런 것들이 모조리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사를 와 보니, 책이 적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집이 좁거든요. 사실은 책 때문에 별채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버리고 싶은 생각은 아직 추호도 없거든요. 여러번 자꾸 읽은 책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그리해야겠다싶은 책은 따로 모여 있습니다. 한동안 책을 잘 못 읽고 있지만, 차차 책 읽을 시간이 늘어나겠지요. 그게 아주 기대되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에요. 아마, 블로그를 꾸준히 쓴다면, 책 읽는 것에 따라 글투도 달라질 게 틀림없습니다.
음악은, 그 때의 기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스스로 기분을 맞춰주고 싶거나, 어떤 기분에 홈빡 빠져있거나, 빠지고 싶거나, 그럴 때는 주저없이 음악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음악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영화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영화는 결국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라, 좀 다르고. 게다가 영화는 아무래도 책 뒷자리이니까. 눈물이 나거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거나, 그런 건 대체로 음악의 힘입니다. 그런 노래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노래 또한 큰 힘이었던 거죠.
미술은 정말 어려운 공부. 정말이지, 미술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자세. 차라리 사람들의 옷이나 도구, 집, 가꾸는 땅.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라면 너무나 좋은, 좋아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미술-회화,조각,설치 따위'는 대개 공부하듯 대했던 듯. 아마 그런 점에서라도 첫 직장을 일찍이 때려치운 것이 잘 한 짓.
사진은 무척 게을러질 때의 메모, 혹은 일기 대용품. 사진은 찍기는 많이 찍었을 텐데(일 때문에도 그랬고.) 눈을 떼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도 많이 찍을 거 같고, 그렇지만 결국 그리 호감이 가지는 않는 어떤 것이지요.
여기까지 쓰고 나니 무슨 얘기를 썼나 싶습니다. 어디 다른 집에서도 마저 남은 상추를 뜯으면 좋을 텐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