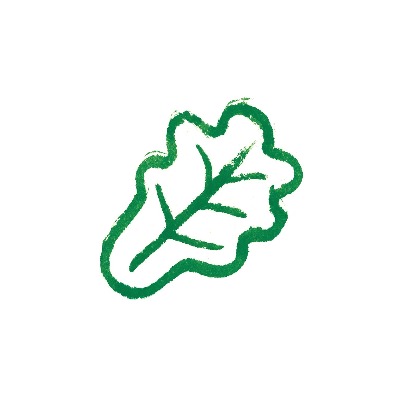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집 앞 개울 건너에 대밭이 있습니다.(대밭에 개울이라니,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가서는 명박이 거시기는 쥐 거시기다. 소리라도 치고 올 요량으로 가 보았습니다. 헌데 들어서자마자 놀란 까투리가 후다다닥 뛰어달아나고, 온갖 잡새가 푸드덕거리고 날아오르는 데다가, 좀 음습하고 어두침침한 것이 썩 내키지 않아서 그냥 돌아나왔습니다.
동네 할매들은 딸아이만 보면 내내 좋아라 하십니다. 어디서 종일 일하고 다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하시던 분이 맞나 싶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그런 건지 다른 곳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보면 누구나가 다 하는 인사가 '안 낳아서 안 크지.' 입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 했어요. 지금은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역시 그래도 인사말 치고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못난이, 밉상, 개똥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예전에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도 미리 들어놨으니 알고 있었는데, '안 낳아서 안 크지.'를 연일 듣고 있으면, 이게 또 낳으라는 얘기인지, 본인도 낳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이구 잘 큰다' 하는 얘기인지. 아, 그리고 밉상, 못난이 이런 말은 정말 한 마디 하실 때마다 뒤에 붙입니다. 말만 듣고 있으면 세상 천지에 어디 이리도 못난 아이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애기 앞에서 얼러주고 그러다가 애가 울기라도 하면 서운해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옆집에 일흔쯤 되신 할매 할배가 사시는데, 막내아들 손주가 우리집 아이랑 비슷합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할매가 먼저 오셨습니다. 앵두를 한 소쿠리 따 가지고 오셔서는 아이 주랍니다. 냉큼 받아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먹다 남은 것은 냉동실에 얼려 두었습니다.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얼린 앵두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러고 있는데, 할배가 오셨습니다.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왔네.' 잠깐 뜸을 들이십니다. '내가 농사가 좀 있어서 새북부터 경운기 몰고 그래. 시끄럽지?' '아니요, 뭘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동네 마을회관 뒷집, 그러니까 정말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샷시문이면 방음이라도 좀 되지요. 창호지 바른 문은 문밖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고스란히 들려줍니다. 자고 있으면, 어느 집 경운기든 마당앞을 지나갑니다. 한동안 경운기 소리때문에 새북 일찍 잠을 깼는데, 이것도 금세 적응이 되어서 요즘은 마을 방송이 아니면 경운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애 키우느라 불편할텐데 시끄럽어도 자네가 양해 좀 해 주게." "네?"
자주 소식 좀 올리라 하셨는데, 게으름은 한없이 늘어나서 그런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지난 녹평을 받아서 죽 넘기다가 맨처음 들어온 대목이 '매일이 일요일이었던 수렵채취 원시농경민족'이었습니다. 집수리에 아르바이트에 아기도 있고, 뭐 그렇다지만. 논이 넓은 것도 아닌데, 농사일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한해 묵힌 논에서 난다는 잡초는 뭐 하나 빠짐없이 자라고 있고, 논두렁은 쑥대밭이고고요. 제가 서툰 낫질로다가 길지도 않은 논두렁 며칠에 나눠서 풀베고 있었더니, 보다 못한 논이웃 어르신들이 자기 논하고 마주한 쪽은 말끔하게 풀을 베어주셨습니다. 이제 밀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논에 사람 드나든 태가 조금 납니다. 요 며칠 그렇게 논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 글 올리는 것, 엄두도 내지 못 했겠지요.
언젠가 제가 게시판에 아콤다라고 노래 올린 적이 있었지요. 그 친구가 산청 살다가 얼마전에 악양으로 왔어요. 걸어서 30분쯤 되는 거리에 삽니다. 아이도 비슷한 또래고, 자주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어요. 집은 들어와 살 만큼 고치기는 했지만.(저희 기준입니다. 아직 뒷간도 없고, -똥 눌 때는 마을 동사에 딸린 화장실이나 또 다른 화장실이나...- 하수도도 그렇고, 전등도 달아야 하고. 또...) 아래채 짓는 것 해서 앞으로 일년은 해야 할 테고, 통장은 마이너스라 한동안 알바도 해야 하고. 그렇거나 말거나, 손님방으로 쓸 방도 하나 있고. 한해 먹을 양식도 모자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