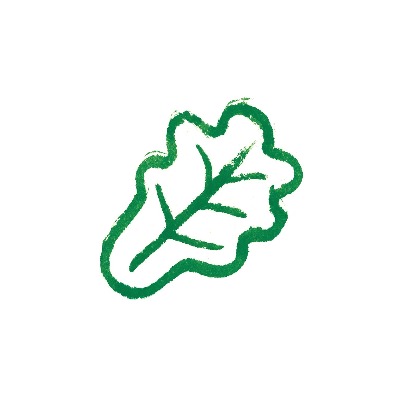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집을 짓고 있거나, 고치거나, 곧 지을 예정이거나, 가까이에 이런 사람들이 꽤 여럿이다.
여기서 가까이는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가까이 사는'이기도 하다.
낡고 오래된 나무 뒤주 한 채와 마당 흙바닥과 방바닥 높이가 같았던 세멘 브로끄 홑겹 건물 한 채가
사무실과 놀이방, 때때로 손님방의 용도로 쓰일 아래채로 바뀌고 있다.
집짓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공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얼개가 드러나 보이니까 안심이 된다.
새해 첫날에 담장을 헐면서, 동동이가 태어나기 전에!!라는 작심으로
시작된 일은 이헌이가 태어난지 백일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집짓기에 매달려 일한 날짜로 따진다면 열흘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의 맨처음 자문을 구했던 목수는 사람 기다리는 일이 일정의 태반이라고 친절히 일러주었다.
큰 일은 대부분 남의 손을 쓴데다가, 집을 짓는 방식도 들어가 살기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만 아니라면
'최대한 후딱, 최대한 저렴'의 원칙으로 짓고 있다. 그러니 아정의 작은집 프로젝트에 견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가 닦는다는 도가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집짓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주 주워섬기는 말은
'날일로 하면 지나가던 개가 오줌눌까 걱정이고, 돈내기로 하면 일꾼이 죽을까 걱정.'이라는 말과
'집은 새로 짓지 않고, 배는 헌 것을 사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둘 모두 앓는 소리하는 것들이다.
블로그에 한두번 글을 올리는 것이 아주 오랜만인 까닭도, 풀어놓자면 이런 앓는 소리만 내리 사나흘
주절거릴지 모르겠다.
집을 짓는 경험으로는 이쪽 바닥에서 아주 얄팍한 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짓기를 통해 삶의 다른 차원으로 비약하셨거나(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집을 한채 지으면
청년은 아저씨가 되고, 아저씨는 할배의 문턱에 들어선다.)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자신감으로다가 집짓기에 대해서도 책을 한 권 꾸려볼 요량이 생겼다.
책에는 집터를 정하는 이야기도 들어갈테지. 집터를 정하는 방법에서, 귀농한 사람과 대대로 살던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난다. 옆 마을에 새로 지은 집이 있었는데, 집은 비싼 돈을 들여 지었지만, 집터는 아주
엉망이었다. 마당도 좁고, 앞집과 너무 가차워서 갑갑하고. 듣기로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라는데.
말이다. 하지만, 어쨌든 대대로 살던 사람은 길을 넓히느라 집이 헐리거나 하는 따위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터를 옮기지 않는다. 농사짓는 땅에 집을 엎어놓는 짓도 하지 않는다. 평판이 좋지 않은
부자라도 새집을 짓는다면서 멀쩡한 농지를 망가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아진이는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만족. 공구가 즐비한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난간도 없는 계단을 잘도 오르내린다. 어서 아래채가 완성되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저 혼자 알아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기만 기대하고 있다.
*덧.
매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께 감사.
매실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올해 첫 수확이니까요.
아직은 가격도 미정.
매실은 따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새파랗고 단단하던 것이
살구처럼 노랗게 익습니다. 효소든 매실주든 담그실 요량이라면
필요한 양을 말씀해주시면, 매실을 따서 바로 그날 택배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야 받으신 다음에
하루이틀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작년까지는 약도 치고, 비료도 했던 매실나무입니다.
올해 저희가 땅을 사고부터 농약과 비료없이 기르는 것이지요.
밭에는 매화나무가 너무 많아서요, 차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해마다 매실이 꽤 나오겠지요. 주문을 넉넉히 하셔도
매실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