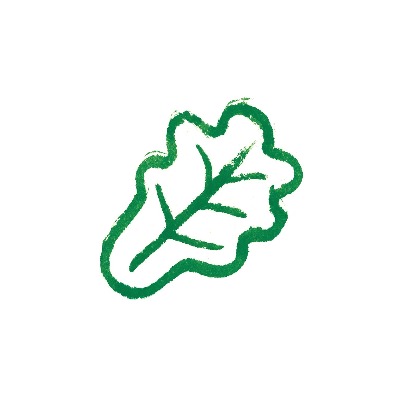티스토리 뷰
옥수수라는 제목으로 세번째.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거나 3학년이거나. 그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외가집에서 여름 방학을 보낼 때였다.
옥수수 삶은 것을 먹고는
(맛있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익숙한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
급체를 해서 생꿀을 한 주발 먹고, 열이 올라
외할머니 등에 업혀 보건소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그 일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옥수수는 찐 것이든, 구운 것이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작년 봄에 글을 올릴 때는 호기롭게도
종자를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소작했던 것이 얼그러져서 제대로 옥수수 맛도 보기 어려웠다.
올해는 아무 소리 없이. 처음으로 마련한 밭뙈기에 옥수수를 심었다.
옥수수 딸 때가 되었으나, 태풍에 물난리에 옥수수는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 아예 뿌리가 드러나 뒤집어지기도 했으나,
그래도 알알이 영근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미 다 익었을 줄 알았지만,
옥수수 따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오늘에서야, 그러니까 9월이 되어서야!
첫 옥수수.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으니,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옥수수는 그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한맛 한다는 옥수수, 어렵게 어렵게 구한 것이 있을 때에나,
그리고, 딴 지 하루이틀 넘기지 않은 것이라야
기껏 한 두 개 먹어주곤 했다.
물론, 봄이도 옥수수를 가려 먹기는 하지만
--봄이는 유기농인 것, 신선한 것, 제철인 것. 방금 요리한 것.만 주로 먹는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민한 혀로 알아내시고는 아주 대놓고 차별하신다.--
다른 모든 것을 빼고, 옥수수 만큼은 식구들 가운데 내가 가장 예민한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번 옥수수는 놀랄 만큼 맛나다.
고소하고, 탱글거리고, 쫀득하다.
내가 옥수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옥수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싶다.

아이들과 아내와 저녁 한끼를 오롯이 옥수수만으로 때운다.
때운다기 보다, 다른 음식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맛이 있으니, 사람들과 나누어 볼까, 밭에 쫌 더 있던데, 팔까?
생각도 난다.
올해는 쫌 그렇고, 내년을 준비해 봐야지.
다만 옥수수는 무엇보다 따는 순간부터 맛이 떨어지는 속도가 유난한 것이니,
택배는 불가.ㅋㅋ

자, 9월입니다.
오랫만에 '그래도 9월이다' 노래를 걸고,
비도 다 지나갔다 믿고,
조만간, 온 집안을 뒤집어 탁탁 털어서
햇볕에 바싹바싹 널어 말릴 생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