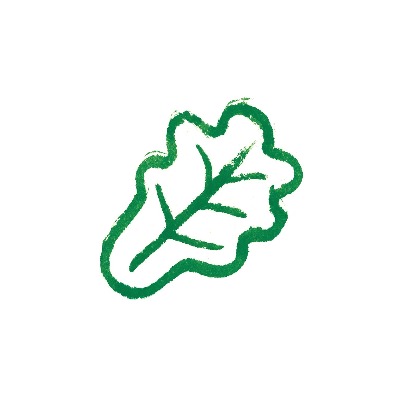감자밭
감자밭
올해부터 부쳐 먹기로 한 밭에 감자부터 심었습니다. 관리기로 밭을 가는 일은 괭이로 하는 것보다야 말도 안 되게 쉬운 일이겠지만, 괭이나 쟁기를 다루어 보지 않은 저로서는 전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깊이 갈아야 하는지, 지나온 자리가 갈리기는 한 건지, 책을 보고 하는 일이라면, 몇 cm간격에 깊이도 몇cm, 속도는 몇 단. 이래 써 있겠지만, 다른 감자밭 갈아놓은 것을 잘 살펴보지 않았으니, 당최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가는 게 좋고, 맨땅이 없게 차근차근 해야지.' 제가 엉성하게 갈아놓은 밭에서 감자를 심고, 괭이질을 하시는 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그저 찬찬히 살펴봅니다. 주말농장 할 때는 감자를 심을 때 '몇 등분, 몇 등분' 하는 식으로 잘라서 심는다고 배웠습니다만..
 봄눈, 봄꽃, 밀.
봄눈, 봄꽃, 밀.
눈이 귀한 이곳에서도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고, 추웠습니다.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장마처럼 비가 오고, 다시 춥고 하다가, 3월 중순에 눈이 왔습니다. 점심 먹을 때쯤 되니 논에 눈은 녹았습니다. 그래도 뒷산에는 눈이 계속 날리고 있더군요. 밀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배게 뿌렸는가 싶습니다. 다른 집 밀밭보다 더 빡빡하게 자라고 있어요. 더 쑥쑥 자라야 할 때, 저마다 자기 자리가 적당히 있어야 할 텐데요. 솎아 줄 형편도 아니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저희 논 바로 옆, 할아버지 밭에서 자라는 매실에 꽃이 피었습니다. 악양에서 볕이 가장 따뜻한 마을에서는 지난 주 초 쯤부터 매화 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했구요. 작년 봄에는 (역시나) 날씨가 이상하여서, 매화에, 벚꽃에, 산수유에..
 달집 - 대보름
달집 - 대보름
달집. 며칠 전부터 마을 여기저기 대밭에서 끝이 가물가물할 만큼 높은 대나무들을 한 묶음씩 베어내더니 무디미 들(평사리)에 달집을 올렸다. 아마도 악양면 사람들 모이기로는 면민체육대회보다 더 모이지 않나 싶은 날. 보름. 다른 명절이야 도시 나간 자식들 돌아온 것 챙기느라 웅성웅성하기는 해도, 집집이 틀어박혀 있게 마련인데, 보름만큼은 마을 명절. 봄이 손을 잡고 달집 태우는 것 보러 간다. 몇년 전부터는 무슨무슨 축제인지 행사인지 하는 이름을 달고 한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할매들은 난장이 공연패에 마음을 빼앗기고, 할배들은 널따란 멍석자리 윷판에 둘러서서 말을 들었다 놨다 고함소리가 오간다. 연휴 사이 일요일이었던 덕분에 관광객들도 적지 않게 왔다. 떡국에 음료수에 녹차 따위 달라는대로 퍼 주는 것..
 새해인사
새해인사
설 쇠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늦었지만, 이곳에 다녀가시는 분들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는 북한산 바로 아래이지요. 어릴 적에 저 산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들어가곤 했던 장면이 또렷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는, 기회만 생기면 친구와 함께 깜깜한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날이 훤해져서야 내려오기도 했구요. 그러니 제게 서울,은 변두리 저 산 아래 동네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제법 길게 서울에서 묵었던 덕분에 반가운 사람들 여럿을 만나고, (그 중에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있었어요. 얼굴을 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왜 그리 ..
 구례 동아식당
구례 동아식당
그동안 쌀 팔고, 유자차, 배쨈, 효소 팔아서 번 돈으로다가 밥 한 끼 사 먹고 왔다. 아정의 블로그를 통해서나, 또 이곳을 직접 찾아주거나 했던 몇몇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그저 사진 몇 장, 글 몇 줄만 보고 이것저것 사 주고, 응원해 준 덕분이다. 그 중 누구든 악양에 들르게 된다면, 더 기껍고도 즐거운 밥 한 끼를 하겠지만,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지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더 무럭무럭 피어날까. 기껏해야 일년에 몇 번 있을 점빵이지만, 이제 곧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번은 꼭 할 일이었다. 방바닥이 궁뎅이 덕 본다는 추위도 조금 누그러졌겠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 나섰다. 사는 곳은 경남 하동 악양인데, 장 보러 ..
 2000년 지나서 10년.
2000년 지나서 10년.
2009년 마지막 날 아침. 악양에 눈이 내렸다. 봄이 엄마가 어렸을 때는 눈사람을 만들고, 얼음이 꽝꽝 언 무논에서 썰매를 탔다고 했지만, 자꾸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악양에 눈 쌓이는 일은 드문 일이 되었다. 방문 열고 나왔더니, 마당에, 골목길에, 돌담에, 지붕에, 눈이다. 대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을 어귀까지 쓰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고 들어와서는 부랴부랴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삼촌이 사 준 부츠를 외갓집에 두고 왔다. 그것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손가락 장갑을 벙어리 장갑 끼우듯 하고는, 고무신을 신겼다. 차갑고, 뽀드득거리는 것을 느끼기에는 더 좋겠지. 그 사이 해가 떠서, 담장 안으로 볕이 들기 시작했다. 마당에 내려놓았더니,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발자국 구경하면서 돌아다닌다. ..
 유자차
유자차
처음부터 유자차를 담글 작정은 아니었는데... 처남이 한동안 거제도에서 지냈어요. 어느 날 와서는 하는 말이 시장에 유기농 유자가 나왔는데, 생긴 게 못 생기고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산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덤으로 준다고 하는 걸 안 받아 가더래요. 못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 한의원 하는 집에 유자밭이 있다는데, 거기거 유기농으로 키운 걸 팔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동네 시장 과일가게에 부탁해서 파는 거라지요. 참, 아직도 유기농 과일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더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겨울에 유자차만큼 달고 맛있고 따끈한 게 없는데(제대로 담근 거라면 모과도 좋지. 흠) 유자는 껍질째 먹잖아요. 농약친 것은 먹기 싫은 덕분에 머릿속에 쓸데없이 아는 게 생기고는..
면사무소 앞에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그저 동네마다 있는 마트 정도이지만, 이곳에서는 면에서 가장 큰 가게이지요. 가게에 통 가는 일이 없는 할매 할배를 빼고는 어지간한 면 사람들은 다 드나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작이 한달쯤 남았을 때,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묻습니다. '나락 잘 됐나?' 그때만 해도 과연 올해 타작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농약 안 친거야 우렁이가 대신 해 줘서 그럭저럭 풀은 없었지만, 비료 안 하고, 그나마 유기농 자재라고 사다가 넣은 퇴비나 효소 따위는 타이밍 놓쳐, 양은 모잘라, 성분은 신경 안 써. 게다가 물대기도 엉망이었지요. 덕분에 타작할 때가 되어가는데도 나락 사이로 골이 훤히 드러나서 논바닥이 보입니다. 남들 ..